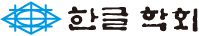*** 애국가를 순 우리말로 한다면?
테리우스: '새파물'은 그냥 '샛바다', '환고은 가람뫼'를 '환곤갈뫼'라했는데 이걸 '환곤가람뫼'
'쇠거적 두른듯'은 '쇠옷을 두른듯' 이 좋을 것 같고 '않변함은' 않바뀜은'으로 요견 변자가 한문아닌가요? 그래서 바꾸었고 '대한'을 '환한'으로 바꾼건 정말 기가 막힐
좋은 말 이라고 여깁니다. -[2004/11/13-12:08]-
우리: 그간 독자님들의 수정안이 들어온것 중에 정리한 내용
* 바람서리 不變함은에서 ' 않변함은' 이라 했는데 變을 한자로 파악지 못한것은 필자의실수. 테리우스 님의 제안대로 ' 않바뀜' 으로 확정.
* 東海의 우리말을 '새파물' 에서 '샛바다'로 하자는 의견
* ' 鐵甲을' '쇠거적' 에서 거적은 거지들의 옷 같은 느낌이 들므로 원안대로 그냥 ' '쇠옷을...' , 쇠거죽...', '쇠가죽...' , '쇠겉옷...' 하자는 의견
* '환곤갈뫼' 를 음절상 한 글자 추가되도 ' 환곤가람뫼' 로 하자는 의견
-[2004/11/13-13:14]-
밝은생활: 저는 애국가의 가사 까지도 순 우리말로 할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바꿔보니 더 아름답네요. 그러나 전 아직 그 수정안에 동참할 실력이 못되지만 우리님도 모르고 지나간 변 이 한자 變이라고 테리우스 님이 찾아낸 것은 참 예민한 감각입니다. 전 이 순 우리말 애국가를 최소한 한글학회 공식행사에서는 불렀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한나라 환한사람 참 멋집니다. 우리 통일한국의 이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2004/11/13-13:56]-
복덩이: 제 의견도 똑같아여. ㅎㅎㅎ -[2004/11/13-14:22]-
테리우스: '않지는' , '않바뀜'은 '안 지는' '안 바뀜' 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아니'의 준말은 '안'이고 하지않는다는 뜻으로는 뒤에 붙어, 먹지 '않다'. ,하지 '않다'. 요렇게 쓰이는군요 -[2004/11/13-22:12]-
우리: 테리우스님 그건 현대 맞춤법인데 이걸 잘못표현한것은 내 손자에게 용돈을 주지 못안 탓임니다.그러나 현대 한글이 얼마나 망처저젔나 또 맞움법이 얼나나 잘못되었는가 다음메 글릉을 올릴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2004/11/14-22:32]-
우리: 초가삼간 불질러 놓고 싸래기 한도막 가지고 이건 쌀이다, 보리쌀 이라 따지는것이 현재 맞춤법 이론 입니다. 현재 이 망처진 한글과 마춤법이 얼아나 잘못됬는지는 현재 필자가의 이론이 거의 완성단게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람니다. -[2004/11/14-23:15]-
테리우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상 (氣像) 이 맞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서리에도 꿋꿋하게 버티는소나무의 모습 처럼 우리도 그리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 하면 날씨라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2004/11/17-09:43]-
테리우스: 그러니까 '남산위에 있는 저소나무가 철갑을 두른듯이 모진 바람과 추위(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꿋꿋하고 올곧은 마음과 같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두개의 기상은 기상 (氣象)과 기상 (氣像) 이 아니라 둘다 기상 (氣像) 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11/17-09:45]-
님보고: 우리님의 여러 글을 읽고 그 깊고 넓은 앎과 어름을 높이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노래를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하심에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도 우리말 사랑하는 일에 늦게 나마 눈을 뜨게 되어 한 번 생각한 바가 있어
올리니 얼러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새바다와 흰두루가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을 흰두루라 부른다고 하여 힌두루로 하였습니다
(백기완님께서 메가 높아 흰구름을 메에 두르고 있다하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돌보시어 우리나라 잘해
* 만세는 오랜때를 나타내므로 잘해(억년)로 하고 잘한다와도 겹치고 말가락도 맞출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우게 활짝피는 아름다운 땅
* 무궁화는 무우게, 무강(사투리)이라 불렀다 하여 그렇게 하고, 삼천리 화려강산은 우리나라 울을 세즈믄리로 좁게 보는 것은 간도문제라든가 여러문제가 있으므로 삼천리는 빼고, 화려강산은 그냥 아름 -[2004/11/18-02:57]-
우리: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간 지금쓴느 한자 단어도 전부터 우리말로 했으면 하나도 걸린게 없는데 지금은 우리말로 하고 일일이 토를 달아야 하니...그래서 한번 해본겁니다.
감사합니다. -[2004/11/18-19:23]-
둔무새: 우리말 공부가 돼니 해 볼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부를 때 딴 뜻으로 들리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환한 사람 -> 화난 사람
'우리 기상일세'의 '기상'은 '날씨'가 아닙니다. -[2005/03/20-12:10]-
ohyouknow: 아이디어가 넘넘 뛰어나서... 뭐라 표현을 못할 정도내요.
강력히 지원합니다.
발기인을 만들도록 노력 합시다. -[2005/04/21-14:25]-
글 쓰는 이(필자)가 쓰는 글 중에는 한자용어가 너무 많다고 화살을 쏘는 글 읽는 이(독자)가 많으므로 가급적 우리말을 쓰려 해도 우리는 그간 너무 오랫동안 한자 권에 젖어 한자용어가 우리말같이 되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우리말로 써도 (...)를 붙여 해설을 해야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 이는 번거롭기가 짝이 없어 그대로 한자용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잘 연구해보면 얼마던지 아름다음 우리말로도 말할 것 같아 그 예로 애국가를 순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본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나 백두산 같은 고유명사는 그대로 둔다면 순 우리말로 생각할 필요도 없으므로 모두 우리말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그냥 우리 뿌리말 찾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본 것이고 독자들과 토론을 해본다면 더 좋은 말들이 나올 것이다.
( 그간 독자님들의 의견과 조정하영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으나 더 좋은말이 있이신분은 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 愛國歌
나라 사랑노래
1.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토록
셋바다와 힌오름이 마르도 닳토록
2.하느님이 保祐하사 우리나라 萬世
하느님이 보살피어 우리나라 온곱해
3.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환한꽃 세즘말 환곤가람뫼
4.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환한사람 환한으로 길이 지키이세
5.南山위에 저소나무 鐵甲을 두른듯
마뫼위에 저소나무 쇠옷을 두른듯 ( 마뫼위에를 '앞쪽뫼에' 로 수정)
6.바람서리 不變함은 우리 氣象일세
바람서리 안바뀜은 우리 날씨일세
7. 가을하늘 空豁한데 높고 구름없어
가을하늘 비고넓어 높고 구름없이
8.밝은달은 우리가슴 一片丹心일세
밝은달은 우리가슴 늘한마음일세
9.이氣象과 이맘으로 忠誠을 다하여
이얼씨와 이맘으로 나라를 위하여
10.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해설
1.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토록
샛바다와 힌오름이 마르고 닳토록
* 東- 동쪽의 우리말은 '새' 이다. 東西南北의 우리말은 사전에도 없는데 바람의 방향에 목숨을 건 옛날 뱃사람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는 그들만의 은어가 아니라 우리민족이 써오던 사실 말임이 천부인 풀이 상 입증된다.
'ㅅ'은 천부인상 서거나 솟는 뜻이 있으므로 솟는 해의 방향을 말하다 보니 '날이 새다', 새벽 등에 쓰여 지던 말이다. 샛파람, 시마바람(동남풍)
*海 - 이는 바다인데 이 바다는 ' 파라하다' 에서 나온 말이다. 바닷물이 파라니 '샛파물' 이라해도 되는데 이것이 파라하다 > 파다 > 바다가 이미 된 말이니 '샛바다'로 한다.
白 - 히다 인데 이는 우리말에서 모음이 혼동되므로 하야하다 > 하얏다와 같은 말이고 '하'는 천부인상 '해' 를 말한다. 즉 '하' 에서 우리의 감초격 접미가 '이' 가 붙어 ( 갑순이, 갑돌이, 호랑이, 고양이, 뜸북이, 깣이 > 까치등) 하 + 이 = 해가 된 것이고 이 해의 색갈을 '하얏기(히)기 때문에 해를 그냥 '하' 나 '히' 라로도 한다. (아사히 신문 -あさひ新聞)- 아침신문(朝日新聞, 일본어의 70%는 우리말임).
頭 - 머리두자 이다. 그런데 이 머리는 세종 때 까지만 했어도 '마리' 였었다. 전에는 산을 '오름이라고 했었다. (세 고지 오름날을 헤어갈제 - 세 화랑이 등산갈날을 헤아릴때..)
그래서 힌말뫼와 힌오름을 망서렸는데 이 이유를 보자
'ㅁ'은 천부인상' 모가진 물질' ( 원시에는 땅이 모가진 것으로 알았다) 즉 ' 땅을 의미하며 또한 물보다 높은곳을 말하다보니 높은 뜻으로도 쓰여 저 ' 상감마마, 마마님, 마님 등에 쓰여 젓고 그래서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마리(머리)라 했다.
이 '마리'는 세종 때 까지만 해도 그대로 마리였는데 그 후 사람과 짐승의 마리를 구구분하기 위하여 사람에게만은 ' 머리' 라 했으므로 짐승은 지금도 ' 한 마리 두 마리' 한다.
지금 강화도의 마니산(摩尼山)은 원래 마리뫼 > 말뫼 이었다. 이 산 이름이 말뫼 이었던 것은 초대단군 왕검님이 태자 부르(2대 부르단군)에게 명하여 이 산이 천하의 명산이므로 '말뫼' 라 명하고 여기에 참성단을 쌓게 한데서 나온 이름이다.
이것이 불교의 영향을 받으며 불교용어인 마니산이 된 것이니 뜻있는 분들은 이 이름을 하루바삐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 山 - 이는 우리말로 뫼 인데 원래 '뫼' 란 물보다 높은 땅, 즉 평지보다 좀 높은 땅 의 의미를 가지므로 백두산등 높은 산에 붙일 성질은 아니나 이젠 자주 써오다 보니 山은 뫼가 되었다.
높은 산의 우리말은 ' 오름' 이고 그 근거는 지금 제주도 한라산의 '윗세오름' 으로 남아 있다.
* 여기서 동해물을 새 바다로 했고 음절 상 '새받물'로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밭(田)과 혼동이 와서 '새파물' 로도 생각 한 것이며 그렇다면 구지 말의 뿌리를 찾지 않는다고 해도 ' 동쪽의 파란 물이 되니 이건 동해를 바로 말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 이를 파물 이라고 썼었으나 샛박다가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백두산을 '한밝뫼'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太白山과 혼동이 온다. 그러나 실은 태백산도 백두산과 그 의미는 같다.
2. 하느님이 保祐하사 우리나라 萬世
하느님이 보살피어 우리나라 온곱해
* 保祐 - 이는 보살피다 면 될 것 같고
* 萬世 - 이건 좀 문제다. 萬世를 글자 해석대로 하면 '만 세대'로 길다는 뜻인데 이 萬은 월인천강지곡 등에는 '먼' 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이는 한자 萬의 세종 때 발음으로 봐야하고 우리말로는 '곱백' 이라는 말이 있다. 즉 百을 곱한다는 이야기이고이것이 변하여 '골백번 죽어도' 의 '골백'이 된다. 그러나 百역시 한자이다.
百의 우리말은 온 세상 하는 '온'이다. 그렇다면 '곱온' 해야 되는데 이는 발음이 좋지 않아 '온곱' 이라 할 수 있으나 다음 世가 문제다. 世는 원래 世代를 말하니 '차레' 라고 할 수도 없고 '만세의 世 우리말은 누리이니 '온곱누리' 이나 음절상의 맞지 안아 그냥 '길게' 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무력한것 같아 '해', 즉 '온곱해' 라고 했다. 즉 만세를 萬歲 라고 할수도 있기때문이다.
환한꽃 세즘말 환곤가람뫼
* 無窮花 - 우리말로 '궁진함이 없는꽃'이나 窮盡이 한자이니 지지 않는 꽃쯤이 좋을 것 같으나 이는 음절 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궁화의 옛말을 찾아 '환한꽃' 이라 했다. 즉 옛날 우리 선조들은 무궁화를 환한꽃(桓花) 이라 했다.
( 檀樹之下桓花之上 - 檀君世記)
* 三千里 의 三은 설명이 필요 없는 셋
* 千里의 千은 우리말 '즈믄' 이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왜 千을 즈믄이라 했는가?
왜초 우리숫자는 열밖에 없었고 그 이상은 '온' 이라 했다. 그 후 사회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숫자가 열밖에 없었다는 근거 참조) 삼세단군 가륵때 와서야 百을 '온'이라 했고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 후 다시 더 큰 숫자의 필요성이 생기자 ' 저믄 날' 같이 아득한 수라는 뜻의 저믄 > '즈믄'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ㅈ'은 천부인으로 만든 ㄱ ㄴ ㄷ ...ㅎ 의미상 서고 세우는 뜻의 'ㅅ'위에 '-'라는 이불을 덮어놓아 잠시 서는 것을 쉬게 하는 뜻이 있으므로 우리말에서 'ㅈ'으로 시작되는 말들의 뿌리를 캐보면 모두 '자다' 에서 나온 말이다.
* 里 - 여기서는 거리의 단위로 써서 4 K를 十里라 하지만 원래는 마을과 마을 사이를 말하던 말이고 이 마을을 단축하여 '말' 이라고도 한다 (윗말, 아랫말)
* 華麗江山의 華 - 빛날화, 환한화
* 麗 - 고을려 > 골려, 고은려 > 곤려( 곤 색갈)
* 江 - 가람. 여기서 우리 선조들은 강을 왜 가람이라 했는가? 'ㄱ' 은 원래 가장자리의 뜻을 가진 글자이다. 이 가장자리 란 말이 진화하여 나무 가지 가장자리 에서 생겨 갈라진 것이 가지(枝)이고 갈라진 물줄기가 모여된 것이 가람(江)이 되니 그 어원은 ‘ 갈’ 이다.
山 - 먼저 백두산에서 설명
4.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환한사람 환한으로 길이 지키이세.
* 大韓-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의 국호인데 이는 우리 한민족 이라는 '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지은 이름이다.
1) '한'의 뜻은 우선 하나님, 한늘님 한울님 등에 쓰드시 하느님의 뜻이 들었다.
2) 한다다( 환하다, 밝다) 하는 뜻이 있다.
3) 크다는 뜻이 들어있다. (대전 = 한밭, 한길 = 큰길, 한새 = 황새, 한물 = 홍수등 20 여가지 좋은 뜻...)
이 위대한 '한'이 무엇이 부족하여 오직 '크다'는 듯밖에 없는 한자 大를 붙였단 말인가?
이는 그 이름을 지을 당시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을 따라간 이름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 하느님이 보우하사..' 도 “大 하느님이 보우하사...' 해야 한단 말인가? 이는 지금 우리의 존엄한 국호이기는 하나 참으로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필자의 졸저 ‘천부인과 천부경의 비밀’ 에서 大韓을 '환한' 아리고 했다. 여기서 '환'은 대략 6 천년 전 신석기 문명이 끝나고 청동기 문명이 시작될 무렵 지금 바이칼호 부근에 사시던 북방계 몽골리안 부족 이름이 '환한부족 즉 환국(桓國)이었고 그 지도자님이 환한님 > 화나님 > 하나님이 된 것이며 이를 그 후 한자가 생기자 桓因 으로 적어놓았으므로 우리의 뿌리는 하느님, 즉 환한님이다.
그후 환숫님(桓雄- 환한나나의 숫컷)으로 이어지던 환나라는 환숫께서 홍익인간을 하시느라고 당시 요즘 싸스와 같은 풍토병으로 고생하던 마치 짐승과 같던 곰족(熊族) 들을 마늘과 쑥으로 치료하시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천부인 사상을 가리키어 사람을 만든 다음 그 곰족 추장의 딸과 결혼을 하여 낳으신 분이 바로 밝은 땅 임금이란 뜻의 단군(檀君)이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마늘과 쑥을 상식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얼마전 그 극성을 떨던 싸스에 한사람도 걸리지 않은 덕분은 마늘을 먹은 덕인지도 모른다.
단군이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이 처음 땅 , 새 땅이라는 아사달(阿斯達) > 앗달 이다. ((아사히 신문( あさひ新聞)- 아침신문(朝日新聞, 일본어의 70%는 우리말임). 또 모음이 혼동되어 아시빨래 아시 김매기등))
따라서 처음, 새로 선 나라 이름은 당연히 아사선(阿斯鮮) > 앗선 이어야 할 것을 후세 한문학자들은 조선(朝鮮)이라 했다.
朝鮮이라 적은 이유는 '아사'는 처음, 새것이므로는 하루의 처음, 새날의 처음은 아침이 되기 때문에 아침朝를 쓰고 鮮은 그냥 음을 차용한 것이다.
이 단군의 조선은 단군혼자 독식하지 않고 천부인의 천지인 셋을 따 선한(晨韓), 붉한( 밝과 붉은 같은말 이었음 > 卞韓), 마한( 말한- 馬韓)등 삼한(三韓)으로 나누어 통치했기 때문에 고려 때 까지만 해도 이 삼한을 통일 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한에 뿌리를 둔 한민족이다.
또 이 어원 말고도 환한 나라, 환한 민족 하면 그 이름도 좋을 것이다.
이상과 같기 때문에 필자는 大韓 대신 환한을 쓴것이고 이는 좀 있으면 통일될 남북한의 국명으로도 좋을것이다. 환한사람 환한나라 !!!
* 保全 - '지키세' 하면 될 것을 음절을 살리느라고 우리의 감초격 접미사 '이' 하나를 덧붙였다.
5.南山위에 저소나무 鐵甲을 두른 듯
마뫼위에 저소나무 쇠옷을 두른듯
* 南山 - 지금 서울의 남산은 목멱산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산이란 희망과 전진을 뜻하는 남쪽 산을 뜻 하는 것으로 보아 南의 우리말인 '마' 를 택했고 이 '마'는 이미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 선조가 우리 만들 때 남쪽 방향까지도 '마' 라 한 것은 원시우리조상들은 여름에는 깃(원두막 같은 것)에서 살았고 겨울에는 굴 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夏則巢居冬則穴處 - 晋書 東夷傳)
이때 굴속은 따뜻하니 땅이란 따뜻한걸로 알았고 그래서 봄에 남쪽으로 부터 훈풍이 불어오면 이는 땅속 굴 구멍과 같이 따듯하므로 여기에서 땅 천부인 'ㅁ'으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 鐵甲 - 철갑은 쇠로 만든 갑옷인데 이 갑옷을 우리말로 옷 이라 하여 '쇠옷을' 했으나 아무래도 옷과 그 위에 걸치는 거적은 다르므로 우리옛말 '거적떼기'의 거적을 쓰려 했다. 이 거적은 뿌리말로 볼때 가죽(皮) 와 같은 말 이므로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던 옛날에는 하등의 잘못이 없었을 것이다. 그라나 지금은 아무래도 거지들이나 걸치는 옷같으므로 그냥 쇠옷이라 했다.
6.바람서리 不變함은 우리 氣象일세
바람서리 안버뀜은 우리 날씨일세
* 不變 - 변치 않음 인데 음절 상 '않변함' 이라 했다. (變이 한자인줄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은 필자의 큰 실수임. 테리우스 님의 의견대로 ' 안바뀜' 으로 수정확정
* 氣象 - 氣象의 뜻은 우선 사람의 타고난 성정(性情)이나 기질(氣質)을 말하다 보니 날씨의 흐리고 맑음과 춥고 더운 것도 말하게 되었다.
여기서 애국가에서 氣象은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전후문장으로 보아 날씨로 보았다.
7.가을하늘 空豁한데 높고 구름없어
가을하늘 비고 넓어 높고 구름 없이 = 가을하늘 비고 넓어 높고 구름 없이
* 空豁 - 공활은 비고 미끄럽고 넓은 것
8.밝은달은 우리가슴 一片丹心일세
밝은달은 우리가슴 늘한마음일세
* 一片丹心 - 처음에는 한 - 마음으로 생각했으나 독자가 '늘' 자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붙이고 보니 음절과도 맞는다.
9.이氣象과 이맘으로 忠誠을 다하여
이얼씨와 이맘으로 나라를 위하여
* 여기의 氣象은 사람의 성정이나 기질을 말하므로 실은 氣相 이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여시서 기상을 '얼씨' 라 한것에 대하여 좀 설명한다.
* 어름(氷)과 아름답다(美)의 어원
'얼' 이나 '알'은 하늘천부인 'ㅇ'으로 만든 말이므로 하늘의 주인 해도 뜻 한다.
이 말들을 모두 밝히려면 책 한권이 되니 여기서 하늘과 해의 뜻을가진 ‘ㅇ’이 왜 ‘얼’, ‘알’ 등에 써지는가만 설명한다.
* 어름(氷)이 왜 하늘과 상관이 있는가? 부터 말한다.
우선 생각하기로는 어름 과 하늘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말에서 검둥이와 감둥이가 같은 말이듯 우리 뿌리 말 에서 모음은 일단 무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름과 아름(美)은 같은 말이다. 여기서 우선 이 말들의 어근인 '알' 과 '얼'에 대하여 알아보자.
* 알 - 알( 우리말에서 ㄹ 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유동성 밖에 없다) 은 생명의 씨 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는 당연히 하늘이고 하늘의 주인인 해에게서 온다. 따라서 박혁거세나 김수로 왕이 알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두 하늘의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고 상고사에서 알지,알천, 알영등 알씨들이 많았던 이유도 이와 같다.
* 얼 - 지금 ' 민족의 '얼'을 찾아야 한다' , ' 얼빠진 놈' 하는 얼은 우리 뿌리 말을 전연 연구해 본 일이 없는 언어학자들이 만든 국어사전 의미상 혼( 魂), 이나 정수(精髓)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말에서 ' 얼싸좋다', 얼씨구 절씨구 참도 좋네'등의 말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얼, 즉 혼이나 정수를 오줌 싸듯 싸 버렸으니 좋다는 말인가?
얼인애 > 어린애, 얼인이 > 어린이가 사전대로 혼이라면 이 어린이들이 귀신들인가?
또 '얼인놈이 까불어!' 할 때도 혼이 까불고 있다는 말인가?
참으로 국어사전을 다시 써야 할 말들이 너무도 많다.
'얼'은 사람의 씨인 정액(精液)이고 이 정액은 사람의 정수( 精髓)가 된다. 그러므로 이 정수가 혼(魂) 이라고 한자로 적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얼쑤, 얼싸좋다는 사정(射精), 즉 남녀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좋다는 말이고 '얼씨구 절씨구' 역시 그 행위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말이며 '어린놈이 까불어' 는 아직 정액에 불과한 놈이 까불어 로 지금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까불어' 하는 말보다 더 과장된 말이며 아이들 놀림 말에서 ' 얼나리 꼴라리' 라는 말은 양지쪽에서 수음이라도 하던 아이들이 '정액이 나왔네 꼬물이 나왔네' 이다.
* 다음 우리 순수한 말로 '쎅스 하자' 가 무엇일까? 즉 신혼부부가 신혼여행가서 구경 다하고 먹을 것 다 먹고 호텔 침실에 들어와 마지막 뭐라고 할까? 점잖게 정사(精事)하자고 할까 무식하게 ㅆ ㅂ 하자고 할까?
뭐라고 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저 우물쭈물 거시기 하자고 할까?
어느 독자는 ' 사랑하자' 하면 될 것이아니냐 는데 사랑의 뜻은 思, 즉 생각 하는 것 이므로 나라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한다는 너무나 광범위한 말이다.
이 말이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 자 - 이제 우리 한번 '얼루자' ' 이다.
이 얼을 누는 행위(오줌이나 똥 누드시)를 얼누다 = 얼루다 라고 한다. 즉 쎅스의 우리말은 '얼누다' 가 된다. ( 하긴 뭐라고 하고 그것 할 넘 도 없겠지만...ㅎㅎㅎ)
* 그런데 이 얼을 누자면 남녀의 팔다리나 몸둥이가 꼬이게 된다. 이 꼬이는 행위가 바로 ' 어우름, 얼키다', '얼크러지다' 가 되고 이는 다시 '어울리다' 라로 진화되어 '남녀가 잘 어울리는 한 쌍 ' 이라는 말이 되는가 하면 친구사이도 잘 어울린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더욱 진화하여 산에 칡 넝굴이 '얼키설키' 등의 말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어름(氷)은 물들의 어우름이 단축되어 된 말이다. 즉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진화한 말이다. ( 어우름 > 얼음 > 어름)
* 다음 '얼'과 같은 말인 '알'은 '아우름' 이 되는데 정선의 아우라지가 바로 두 줄기의 강물이 한곳으로 아우러진 (어우러진) 것이 된다.
이 아우름은 단축하면 아름(美) 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어문학 박사들은 ' 아름답다'의 해석을 ' 나답다' 등 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뿌리를 전연 연구하지 않은 말이다.
원래 나 란 임금만이 쓰던 말이고(나日- 衆陽之宗, 君王之表 - 훈몽자회) 평민은 '저'나 '아롬' 즉 쎅스 하느넘 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른 앞에서 '나' 라고 말했다가는 후레아들넘이 된다.
이상 '아름답다'는 동사가 명사가 되어 형용사로 만들어진 말이고 이의 어원은 '쎅스를 잘할 것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스개 소리를 한다면 어떤 아기씨에게 ' 당신 참으로 아름답소' 한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얼굴을 붉혀야 하지 않을까? ㅎㅎㅎ
이상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성정을 '얼'로 표현했다.
10.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한자가 없으니 생략한다.
* 이상 이론이 있으신 분 토를 다실것
3.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