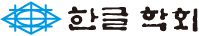한말글 사랑방
갓스물과 갖신 -우리말 돋보기에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54
게시일 :
2005-10-13
말
아래는 한글학회 우리말 돋보기에 실린 리의도님 글입니다.
저와 생각이 좀 다르고 의문이 생겨 이렇게 옮기고 그 사이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표안 분홍색 글씨만 제 글인데 원문과 함께 읽어 보시고
제 국어지식이 무엇이 잘못되었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만일 제 말이 맞고 리이도님이 다르거나 틀렸다면 새로 쓰셔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한글학회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써주시면 제가 우리말 해득하는데 유익하고,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127
따온 데: '…다듬은' 이야기 한글 맞춤법(2004, 석필)
글쓴 이: 리 의도(춘천교대 교수)
2005/8/24(수)
읽음: 351
'갓스물'과 '갖신'
(1)㉠ 갓-스물, 걸핏-하면, 덧-저고리, 돗-자리, 첫-아들, 핫-바지
㉡ 기껏, 무릇, 사뭇, 얼핏, 자칫
위의 낱말들에서 받침 ㅅ은 모두 [ㄷ]로 소리 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 갇-스물, 걸핃-하면, 덛-저고리, 돋-자리, 첟-아들, 핟-바지
㉡ 기껃, 무륻, 사묻, 얼핃, 자칟
[ㄷ] 소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ㄷ 받침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쓰였는데 -옛날에 ㄷ으로 써야 할 것을 ㅅ으로 쓰게된 관행도 있었다고 알며..
아무튼 위에서 ㅅ은 ㄷ 다음에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ㄷ 받침이 원형이고 어원.(어근받침인지 관형격인지 부사형 만드는 건지 상관없이 ㅅ에 앞선)
가까스로는 갇가스로인지 갓가스로인지 모르겠지만 겨우, 간신히와 닮은 말로
(어느 선.한계, 邊.端,極.. 가라는 말이다, 가시, 가생이. 가이없이.. 갇- 어근에서)
갓가스로라는 옛 표기형태가 보입니다. 처음은 처섬>처음이 된 것이라
첫- 어근으로 재구조화(본래 첟-이었겠지만).
갓이라는 말 할 때 가시라는 말로 소리낸다. 가디라는 말로 얘기하지 않고. 얼피시..
걸피시라는 낱말은, 덛-저고리의 더슨, 첫이라는 말은 시공간.사물의 처섬(처음. 반치음으로 약화.소실)
을 뜻한다. 처디라고 소리내지 않는다. 처시.. 위에 낱말들 다 그렇다. 돗자리의 돗은 도시락에도 쓰이는 같은 말인가 그 왕골이나 대나무 같은 것 돗자리를 골풀자리라고도 한다.
그래서 ㅅ받침은 ㄷ으로 소리나는 것을 관습상 ㅅ으로 적는 것 뿐 아니라
어근 재구조화(어근형 재정립, 새말)나 적어도 그 말의 새형태, 기타에 관한 모종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다. 지금 맛있다라는 말은 마딛따 비슷한 소리가 원래 맞는데 언중들이 마싣따로 많이 말해서 별 수 없이 이것도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맏>맛으로 재정립된 셈 아닌가.
입맛이는 입마시.. 가, 가생이가 갇-에서 온 말이지만 갓.. 강원 방언에선 가를 또 갖으로 말한다고 한다.
갓-,갖(가장자리,가장-최고.사물의 邊.端.極..)으로 분화했지 않은가.
깃이란 말도 기슭- 산이나 처마 끝.가생이란 뜻이다.
(1)'㉠ 갇-스물, 걸핃-하면, 덛-저고리, 돋-자리, 첟-아들, 핟-바지
㉡ 기껃, 무륻, 사묻, 얼핃, 자칟
이런 말들이ㄷ받침이 앞섰겠지만 위에서 본것처럼 받칩부분 말이 좀 변하고서
그말대로 ㅅ으로 쓰게 된 건지 아직 안 변하고 ㄷ을 지금껏 유지해오는 말인지 나는 알길이 없다.
누가 가르쳐 알려 주실려나.
아래에 대한 것은 밤에 쓰겠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의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침 소리 [ㄷ]를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찍부터 있어 온 관습입니다. 오늘날도 그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1)과 같이 표기합니다.
그러나 받침 소리가 [ㄷ]라고 해서 무조건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와 같은 낱말은 ㅅ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2) 갖-신 온-갖 엊-저녁 밭-사돈
[갇씬] [온갇] [얻쩌녁] [받싸돈]
이들은 각각 '가죽-신, 온-가지, 어제-저녁, 바깥-사돈'의 준형태(줄어든 형태: 준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갖-신'에서 '갖'의 원형태(본말)는 '가죽'이며, 그 받침 'ㅈ'은 [죽]의 첫소리이기 때문에 발음과는 상관없이 'ㅈ'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도 이에 준하여 이해하면 됩니다.
요컨대, (2)의 낱말은 발음 현상만 보면 (1)의 낱말들과 다르지 않지만 각각 받침을 'ㅈ, ㅌ'으로 적어야 할 분명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1)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
위 (2)번 낱말들도 다 ㄷ으로 발음되는 것은 사실이다.
갖'신은 가죽, 온갖'은 가지, 엊'저녁은 어제, 밭'사돈은 바깥의 준말이라고 쓰였다, '표시한 말이.
원형 즉 본디말과 준말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준말이라고 보아도
어근이나 말이 재구조화된 셈이다. 받침 소리가 ㄷ이라 저런 두 말로 된 것
관형격도 겸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새말이 된 것이다. 우선 본디말과 준말 관계라는 인식이 의아스럽다.
하나하나 짚어보자(짚다는 딮다에서 구개음화 된 말인데 딮의 ㅍ받침이 처음엔 ㅂ이었을 것)
바깥의 준말이 밭-사돈할 때 그 밭인가, 바깥사돈이란 말과 같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 밭(外)의 선행어는 받 <밧ㄱ 이었다,(용비어천가, 국립국어원 사전).
예를들어 팥은 팣이라고도 나오는데 팟ㄱ가 선행어로 (구급방, 국립 국어원 사전) 이 세말이 변이형이되
변천하여 새말이 된 것이다. 음운상 팟ㄱ의 받침 ㅅㄱ은 팥 또는 팣이 되기 쉬운 것이며 이게 다른 말에도 쓰이며 붙박히면 새말이 되는 것이다. 지금 팥이 새말이지 않는가. 숯이란 말도 숫ㄱ의 형태였는데
이런 예로보아 밧ㄱ(外)라는 말이 밭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밖이지 않는가.
이런 것은 활용하면서 음운적으로 변이하여, 아예 새말로 정착한 것들이다.
바깥이란 말은 밧곁 아니 이보다 앞서 밧ㄱ-곁이라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이다.
<밧곁<여훈>←?+곁> 왜 사전을 참조하지 않는가, 다 나와 있는데..
¶밭다리/밭사돈/밭주인/밭쪽. §[<받<?<용가>] 받이라는 이형태의 말도 한때 보인다.
위 두 문장을 생각해보면 밭이 바깥의 준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밧ㄱ(外)에서 밭이 된 것이다.
팟ㄱ에서 팥이 된 것처럼. 온갖의 갖도 그렇다 가지의 준말인가. 사전에 이렇게 나온다.
갖은 「관」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갖은 고생/갖은 수단/갖은 양념을 넣어 만든 음식/갖은 노력을 다하다/이 집 뒤 광에 있는 쌀과 돈, 갖은 보물이 탐이 납니다.≪김유정, 두포전≫/갖은 곤욕과 모멸과 박대는 각오한 바이나 문제는 노자의 조달이었다.≪한무숙, 만남≫
§[←갖-[<갖'다<석상>]+-은]
갖'다라는 동사가 있었다, 어근 갖-의 모음은 아래아. 또 사전에는 갖가지를 가지가지의 준말이라고 나왔는데 가지의 갖- 과 갖은의 갖-은 실은 동원이다. 가잘비다, 갖추다,가즈런히.. 이런 말들도 동원.
그러니까 갖-이라는 말 어근이 성립하여 여기저기 쓰인다. 나무가지의 가지( <가디)도 닮은 말이며..
근원적으론 가르다, 갈레 이런 말들에서 분화된 것인데 갈-,갋-,갇-,갖-..의 이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가지의 준말이 갖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갖이라는 말이 갇,갓이라는 말들과 함께 존재한다.
옛날 표기론 온갓으로 (남명) 적혀있는데 온갇이라는 말과도 같다. 반드시 갇+ㅣ(접미사)라는
합성어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의 준말이 아니라 저 어근을 갖는 다른 말의 준말과 평등하게
본디말이 무엇인지 정할 수 없는 것이며 그냥 갖이라는 말이 分,종류의 뜻말로 성립해서 쓰인 것.
그외 갖신도 가죽이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갖- 어근에 옥이나 억,악,욱이라는
접미사가 붙은 말 뿐 아니라 갖 어근을 갖는 다른 말들에서도 다 평등하므로
무엇이 본디말인지 정할 수 없다. 가둑,가듁이 가죽이 되기 쉽지만
다른 말에서 갖이라는 새말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
갗(피부),같, 겇, 겉은 이형태인데 겆(거죽),갖과 함께 다 동원이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의 준말이라고 딱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분화하는 여러 말에서 음운환경이 생기고
그러다 어근이 재구조화되어 그 어근을 가지고 도리어
새 합성어(복합어, 파생어)들을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본디말과 준말이라는
그 기술하는 방법이나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싶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아닌 것 같아서. 엊저녁의 엊과 어제도 참 궁금한 말입니다.
어제, 그제라는 말의 어형분석부터 묘연합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어릴 '제'의 이 제, 어릴 '적의'라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만 어제의 제가 그말인가 의심스럽다.
어저께는 어떻게 어형분석이 되는가.
어저에다가 께가 붙었는데 께는 때에서 더 나아가 곳이고(역전께)그런데
엊-라는 어근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아침( <아참)은 더 선행어에
앗- 어근이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른 때 처음 아시 때인데(아사달이 朝鮮, 신시 아닌가)
엇,얻,엊-,앗-하는 어근이 이르고(일,올-) 지난 때를 뜻할 거 같은 느낌이다. 아까는 앗가(번역노걸대).
이상 종잡을 수 없이 썼는데 제 앎,생각이 흐릿하기도 해서 그러지만.. 가시지 않는게 많습니다.
누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