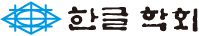< 아리랑과 아사달의 어원 연구 및 두 낱말의 친연성 >
배영수
아리랑과 아사달은 우리 겨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낱말들이다. 아리랑은 겨레의 정서를 대변하고, 아사달은 겨레의 기원인 단군 조선의 도읍지로서 겨레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낱말의 어원을 밝히는 일은 우리 겨레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두 낱말은 유구한 세월 동안 겨레의 역사와 영욕을 함께 해 온 운명 공동체이므로 둘 사이에 관련성도 작지 않을 것이다.
아리랑은 민요 “~ 아리랑”에서 아는 바와 같이 지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고향을 떠난 겨레의 일부가 새로운 정착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족 정서와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원은 겨레의 그것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국어학자 이기문 선생은 알타이 동계어 간의 비교 언어학적 방법으로 “아리라 = 사타구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문 선생은 아리라를 '下'라고 하여 사타구니의 '사이 터(나라)'와 지형적으로 대응시켰는데, 도읍과 관련 수로왕의 일화를 살펴보면 고대 정착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이 새 도읍지의 지형을 묘사하여 여귀의 잎과 같이 좁다고 하였는 바, 고대 도읍지 혹은 정착지가 산골짜기였음을 시사함에 부족하지 않다. 선생의 지형적 해석은 바로 삼국유사의 내용과 부합하여 골짜기의 정착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타구니는 다시 샅과 구니로 나누어 일본어 사토(里), 구니(國)와 비교할 수 있다. 사타구니가 오랜 기원을 지녔다고 볼 때, 고대 한국어라고 고려되는 일본어와 언어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리라를 아리와 (나)라로 나누었을 때 아리는 사토와, (나)라는 구니와 너무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아리는 동아리, 둥우리, 부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의 뜻을 지니고 있고, (나)라는 당연히 구니(國)와 동의어 관계에 있다. 마을을 뜻하는 아리와 샅, 나라를 뜻하는 (나)라나 구니가 고대의 정착지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다.
정착지로서의 아리랑(아리라)을 보다 깊이 연구해 보면, 아리랑은 정착지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임수에 해당한다. 아리랑의 랑은 한자를 포함한 우리말 사용 방법상 라로 읽히기도 한다. 랑과 라는 음운 차이 만큼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 물, 강, 하천 등의 뜻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정착지 아리랑은 마을내가 되어 임수의 뜻을 지니는 것이다.
아사달은 삼국유사에 고조선의 도읍지로 확인된다. 한자 阿斯達을 풀이해 보면 “큰 언덕의 터”가 된다. 阿는 “큰 언덕”의 뜻을 지녀 한국사에서 볼 수 있는 고대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주거 입지를 나타냄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斯는 사잇소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어학자 강길운 선생은 비사벌의 “사(斯)”를 사잇소리라고 밝힌 바, 아사달과 비사벌은 낱말 구조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응된다. 마지막으로 達은 우리말 따, 터를 음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사달은 정착지를 뜻하는 고유어이다. 그러나 아리랑과 같이 보다 깊이 연구해 보면, 정착지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배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사는 아침, 애초, 겨레 등의 뜻을 지녔고, 달은 고대에 산이라고 하였으니 아사달을 애초의 산, 겨레산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말의 문자로서의 기원은 한자에서 비롯되었음이 통설이다. 고대 사회에 문자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한자는 음차로 시작하여 훈차, 훈음차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러한 즉, 삼국유사에 나오는 아사달(阿斯達)의 한자를 차용 방법에 따라 풀이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 에서 제시된 실례들을 모범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사달의 사(斯)는 훈이 '이'가 되어 '아이 = 아리'가 된다. 달은 정착의 터로서 적합한 산을 일컬어 랑과 대응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밝힌다.
삼국유사에 평양은 아사달이라고 한다. 평양은 벌나(도수희), 펴라(신채호) 등으로 재구되는데, 이들은 다시 신채호, 양주동 등의 이론에 따라 아리랑으로의 풀이가 가능하다. 신채호는 음사라고 하였고, 양주동은 자음 탈락으로 해석하였다.
옥편에서 한자 浪(랑)을 검색하면 '조선군명낙랑 (朝鮮郡名樂浪)'이 나오는데, 이는 '조선군의 이름이 낙랑이다.'로 해석된다. 조선은 아사달이고 낙랑은 아리랑이라고 했으니, 아리랑은 아사달과 동의어이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전을 보면 조선과 낙랑은 열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마천이 조선과 낙랑을 동의어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채호는 열수를 아리수라고 하였는데, 아리수는 아리라(랑)이니 조선과 낙랑은 모두 아리랑이 되는데, 낙랑은 아리랑과 같다는 것을 전술하였으니, 특히 조선(아사달)이 아리랑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를 보면 아니랑과 아시랑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와 아리를 유음으로써 같은 말을 가리킨다고 보면 아리랑은 곧 아시랑과 같은 말이 된다. 여기서 아시랑의 尸에 대한 음독은 원래의 이두음인 'ㄹ'과 혹자에 따라 'ㅅ'으로 달리 읽힐 수도 있는데, 아리와 아시의 음차는 바로 尸의 음독 양태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비교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따라 알타이 제어를 살펴보면, 알타이어에 있어서 al, as 는 금(金)의 뜻을 함께 지니는 동의어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지명에 등장하는 금산(金山)은 아리달, 아사달로 읽을 수 있는데, 도읍, 정착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낱말이다. 강길운, 서정범 선생 등은 al을 as보다 더 고어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말과 관련하여, 아리달에서 아사달로 낱말이 변화하였을 개연성도 가져볼 만하다.
우리말 속에서 아리와 아사(아자)는 작다는 뜻과 크다는 뜻을 함께 가진 동의어로 발견된다. 아리랑은 한강과 대응하여 크다는 뜻을 지니지만 병아리는 새끼로서 작다는 뜻을 가진다. 아사달은 수도로서 크다는 뜻을 가지나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등은 작다는 의미를 또한 지닌다. 터로서 달과 랑(령)을 대입하면 아리랑은 아사달과 동의어가 됨에 부족하지 않다.
양주동 선생은 랑을 령(嶺)으로 보는데, 이는 다시 달(達)과 통하는 것을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랑은 또한 일본어 야마와의 대응을 시도해볼 수도 있는데, 야마는 고대 한국어로 보아 라마, 람으로 재구할 수 있는 바, 람과 랑의 동일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로써 랑은 령과 야마와 달(산)과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아리랑과 아사달의 어원 연구와 두 낱말의 친연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리랑과 아사달은 각각의 어원을 크게 두 가지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두 낱말은 공통적인 어원으로 정착지의 뜻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둘째, 두 낱말은 고대 정착지의 조건인 배산임수에서 아사달은 배산, 아리랑은 임수로 어원을 달리 한다. 그러나 두 가지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착지로서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전술한 여러 가지 증명이 두 낱말의 동의어적 성격을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아리랑과 아사달은 고대 겨레 정착지의 뜻을 함께 지니고 있어 동의어 혹은 유의어로서의 친연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