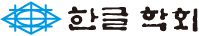한말글 사랑방
옮김 : 천안함 가스터빈실의 우현 선저 좌초를 증명하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92
게시일 :
2012-02-16
천안함 가스터빈실의 우현 선저, 좌초를 증명하다
(서프라이즈 / 철이21 / 2012-02-15)
천안함 사고 해역 암초에 스크래치가 있다
2010년 8월 2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 토론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천안함 사고 해역을 직접 조사해 보니 암초가 있고, 그 암초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인 대표는 천안함은 암초와 충돌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천안함은 백령도 수중암초인 ‘홍합여’에 좌초됐나”에서 천안함 좌초 추정 위치를 밝힌 바 있다.
천안함 사고 당시 백령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측소에서 규모 1.5의 지진을 관측했고, 219.4도 방향에서 공중음파를 관측했다. 천안함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종인 대표가 발견한 암초가 음파관측소에서 219.4도 방향에 있으면 천안함이 그 암초와 충돌해 공중음파가 발생한 것이다.
[동영상 3분 55초부터]
“홍합여라는 사건 초기에 두무진 한 주민이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얘기 들으셨죠. 그 부분을 조사했을 때 사고 2달 후 최문순 의원하고 조사했을 때 바위에 스크래치가 발견이 됐어요.”
이종인 대표가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발견한 스크래치가 있는 암초가 지자연 관측소의 219.4도 방향에 있다면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종인 대표가 발견한 암초가 지자연 관측소 219.4도 방향에 있지 않다면 천안함 사고와는 무관한 암초로 판단된다.
천안함의 어느 부분이 암초와 충돌했는가
이 글에서는 천안함이 좌초됐다면 어느 부분이 암초와 충돌했는지 살펴본다. 전에 쓴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자료를 보충했다. 합조단은 천안함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했다며 어뢰가 폭발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했다. 천안함의 외부 충격이 좌현이 아니라 우현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조단의 주장은 엉터리가 된다.
합조단은 ‘천안함과 같이 함수 선저부에 소나돔이 있는 함정이 항해 중에 좌초하게 되면 소나돔이 먼저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며 좌초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나돔은 천안함 선저에서 일부분만 차지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합조단이 좌초하게 되면 소나돔이 먼저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인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면 소나돔 옆으로 암초가 지나갔을 것이다. 천안함 절단 부위가 가스터빈실이므로 가스터빈실 좌현과 우현 중 한 곳이 충돌 부위이다. 합조단은 가스터빈실 좌현 선저 3m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함 충격은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다.
1) 천안함 함미 변형 형태는 우현 선저 - 좌초를 증명한다
천안함 함미 변형 형태를 보면 천안함 충격은 우현에 있었다. 천안함 함미가 충격으로 변형됐다. 함미의 변형 형태를 보면 충격지점을 알 수 있다. 크게 변형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우현 선저 1,080mm 수축
② 좌현 주갑판 위쪽으로 680mm 변형
③ 함미 높이 위쪽으로 250m 수축
④ 좌현 선저 102m 팽창
⑤ 주갑판 폭 34m 수축
천안함에 외부 충격을 있었다면 그 충격지점이 가장 심하게 변형된다. 함미 변형 상태를 보면 우현 선저가 가장 크게 변형됐다. 1,080mm가 수축된 우현 선저가 합조단이 주장하는 충격지점인 좌현 선저 102m보다 10배가 넘게 변형됐다. 변형 방향도 우현은 수축됐고 좌현은 팽창됐다. 당연히 충격은 우현 선저에서 발생했다.
우현 선저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변형된 곳이 좌현 주갑판이다. 좌현 주갑판이 위로 680m 변형됐다. 우현 선저에서의 충격이 좌현 주갑판으로 이동했다. 천안함 함미 변형 형태는 천안함 외부 충격은 우현 선저에 있었고, 그 충격파가 좌현 주갑판 방향으로 전달됐음을 보여 준다.
합조단은 북한 잠수함이 6.7노트로 북서진하는 천안함의 오른쪽 3km 거리에서 어뢰를 발사했고, 그 어뢰가 천안함 좌현 선저 3m 아래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합조단이 주장하는 충격지점이 좌현 선저이므로 좌현이 가장 크게 변형돼야 한다. 그러나 사고 뒤 천안함은 우현 선저가 가장 크게 변형됐다. 또 좌현 선저에서 어뢰가 폭발했다면 좌현 선저가 수축돼야 하지만 함미 좌현 선저는 오히려 팽창됐다.
천안함은 사고 당시 백령도 서남방 1.2마일 해상을 북서진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해안은 근접해 기동하고 있었으므로 오른쪽에서 북한 잠수함이 공격할 수 없다. 천안함이 만약 잠수함과 충돌했다면 우현 선저가 충돌지점이 돼야 한다. 천안함 오른쪽에 잠수함이 기동할 공간이 없다. 우현 선저 충격은 암초 충돌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2) 천안함 빌지킬 변형 형태는 우현 선저 - 좌초를 증명한다
빌지킬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배 짓는 사람들’
파도나 바람의 영향으로 좌우로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선박에 지느러미 같은 것을 장착해 무게중심을 잡는 장치를 ‘빌지킬(Bilge Keel)’이라 부른다. 빌지킬은 선박 하단의 양옆에 장착된 사다리꼴 모양의 얇고 긴 철판으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선체 종방향으로 길게 설치돼 횡 동요에 대한 저항을 발생시켜 감쇄시킨다.
횡 동요 안정화 장치는 ‘빌지킬’과 ‘핀 스태빌라이저(함안정기 : Fin Stabilizer)’, 러더 스태빌라이저(Rudder Roll Stabilizer) 등이 있다. 위 초계함 모형에서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빌지킬이고,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함안정기이다.
천안함 빌지킬을 보면 우현 빌지킬은 안쪽으로 심하게 꺾였지만 좌현 빌지킬은 약간의 변형만 있었다. 천안함이 좌현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우현 빌지킬이 안쪽으로 휠 수가 없다.
천안함은 충격 뒤 함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두 동강 났다. 이는 외부 충격이 우현 선저에서 발생해 우현 빌지킬이 안쪽으로 심하게 휘었고 그 뒤에 함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두 동강 나면서 좌현 빌지킬의 변형을 가져온 것이다.
우현 빌지길을 주목해야 한다. 천안함 좌현 빌지킬 휨 정도는 우현 빌지킬의 휨 정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합조단이 전선줄을 길게 늘어뜨려 우현 빌지킬을 숨기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뢰가 좌현 선저 3m 아래에서 폭발했다면 우현 빌지킬은 바깥쪽으로 휘어야 한다. 또, 잠수함이 천안함 좌현을 들이받았다면 역시 우현 빌지킬은 바깥쪽으로 휘어야 한다. 우현 빌지킬이 좌현 빌지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쪽으로 크게 휜 것은 천안함을 두 동강 나게 만든 외부 충격이 우현 선저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합조단의 주장대로 어뢰가 천안함 좌현 선저 3m 아래에서 폭발했다면 천안함 함미 좌현 외판이 우현 갑판 쪽으로 휘지 않는다. 천안함 함미 좌현 외판이 갑판 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천안함 가스터빈실의 우현 선저가 암초와 충돌해 크게 훼손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왔고, 함수가 복원력을 상실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찢어진 것이다.
3) 천안함 가스터빈실 유실 부분도 우현 선저 - 좌초를 증명한다
천안함은 가스터빈실을 중심으로 절단되었으며 우현은 약 7.8m가 유실되었고 좌현은 선저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 부분 없이 찢어져 절단되었다. (합조단 보고서 72쪽) 좌현 아래에서 어뢰가 폭발했는데 좌현은 유실부분이 거의 없이 찢어져 절단되고, 우현은 7.8m 강철 외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갈 수 있나. 천안함 유실 부위도 충격이 우현 선저에 있었음을 증명한다.
2010년 5월 17일 민간업체가 현장에 도착, 인양로프 결색 등 준비를 한 후 5월 19일 06:30경 가스터빈실을 인양한 결과 인양된 가스터빈실은 <그림 3장-2-9> 와 같이 선저 및 우현 부분으로 길이 8.7m, 폭 11m 크기였으며 무게는 30톤에 달하였다. (합조단 보고서 110쪽) 우현 외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30톤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저 부분이 암초와 충돌했을 때 가능하다.
천안함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가 암초 충돌 지점이다. 함수 선저 부분에서부터 암초에 긁혔을 것이지만 떨어져 나간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 외판에 충격이 집중됐을 것이다. 합조단이 우현 바닥 버블 흔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암초에 긁힌 흔적일 수 있다.
4) 합조단의 어뢰 폭발 시뮬레이션은 억지다
현재까지 완성된 시뮬레이션은 폭발 뒤 1초까지 선체가 어떻게 변형됐는가를 재현했다. 특히 유실된 부분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세밀하게 보여준다. 정 본부장은 20일 합조단 발표 당시 보여주지 못했던 폭발 0.5초 이후∼1초까지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충격을 받은 발전기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벽면과 함께 뜯겨 나갔다”며 “오른쪽이 더 많이 유실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528/28663659/1
민군합동조사단 선체구조분과에서 천안함이 어떻게 두 동강 났는지를 밝히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맡았다. 어뢰가 좌현 선저 아래에서 폭발했는데도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 외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 이유가 “충격을 받은 발전기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벽면과 함께 뜯겨 나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스터빈실 우현에 있는 발전기가 우현 벽면에 부딪혀 우현 외판이 떨어져 나갔다는 주장이다.
천안함 가스터빈의 길이는 6.68m이다. <그림 2장-2-8> 천안함 가스터빈실 설계도를 보면 발전기의 길이는 가스터빈 길이의 절반 정도로 약 3.3m다. 약 3.3m 길이의 발전기가 천안함 우현 벽면을 밀쳐서 7.8m의 강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뢰가 좌현 선저에서 폭발했는데 좌현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현 외판만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가스터빈실 우현에 있는 발전기가 우현 벽면을 밀어 함께 떨어져 나갔다는 시뮬레이션도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3.3m 발전기가 7.8m 우현 외판을 밀어낼 수도 없다.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의 절단면을 봐도 합조단의 시뮬레이션은 맞지 않다. 위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의 함수 방향 절단면을 보면 모두 바깥쪽으로 휘어 있다. 좌현 선저에서 어뢰가 폭발해 가스터빈실 유실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면 가스터빈실 우현 옆면은 안쪽으로 휘어야 한다. 그러나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의 함수 방향 절단면은 모두 바깥쪽으로 휘었다. 충격이 우현 선저에서 좌현 주갑판으로 이동해야 유실 부위의 함수 방향 절단면이 바깥쪽으로 휘게 된다.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이 암초와 충돌했기 때문에 함수 방향 절단면 모두 바깥쪽으로 휘었다.
결론
천안함 함미 변형 형태, 빌지킬 변형 형태, 가스터빈실 유실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격은 좌현이 아니라 우현 선저에 있었다. 어뢰설, 잠수함 충돌설은 우현 충격을 설명할 수 없다. 우현 선저 충격 원인은 암초 충돌밖에 없다.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을 지나다가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가 암초와 충돌했다. 그 충격으로 가스터빈실 우현 선저 외판이 좌현 갑판 쪽으로 힘을 받아 떨어져 나갔다. 이때 우현 빌지킬도 안쪽으로 휘었다. 천안함 사고 당시 지진계에 관측된 충격파에 첫 충격파 31초 뒤에 천분의 1 정도의 두 번째 충격파가 있었으므로, 가스터빈이 붙어 있는 가스터빈실 선저 외판이 두 동강 난 함수나 함미에 매달려 있다가 사고 31초 뒤 해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대표가 천안함 사고 해역에서 스크래치가 있는 암초를 발견했다. 백령도 어민 이원배 씨도 천안함 사고 해역에 해도에는 없으나 홍합여라 불리는 수중암초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배 씨가 말한 홍합여가 이종인 대표가 발견한 암초인지는 모르겠다.
천안함 사고 시각에 백령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음파관측소에서 219.4도 방향에서 공중음파를 감지했으므로 이원배 씨의 홍합여나 이종인 대표의 스크래치 암초가 지자연 관측소 219.4도 방향에 있으면 천안함은 그 암초와 충돌한 것이다.
철이21
천안함 관련 글
?[천안함] 제3부표 대형구조물이 이스라엘 잠수함으로 판단되는 9가지 근거
?제3부표 이스라엘 잠수함 수색을 천안함 함수 수색으로 위장했는가?
?천안함은 백령도 수중 암초인 ‘홍합여’에 좌초됐나?
?천안함 재판에서 KNTDS를 검증할 때 중요한 점 - 차 하사의 마지막 문자의 의미는?
?천안함 음탐사가 어뢰 소리를 못 듣고, 음탐기 화면에 신호도 없었다면
?“속초함 소나로 천안함 함미를 찾을 수 있었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93161
http://www.seoprise.com/etc/u2/661337